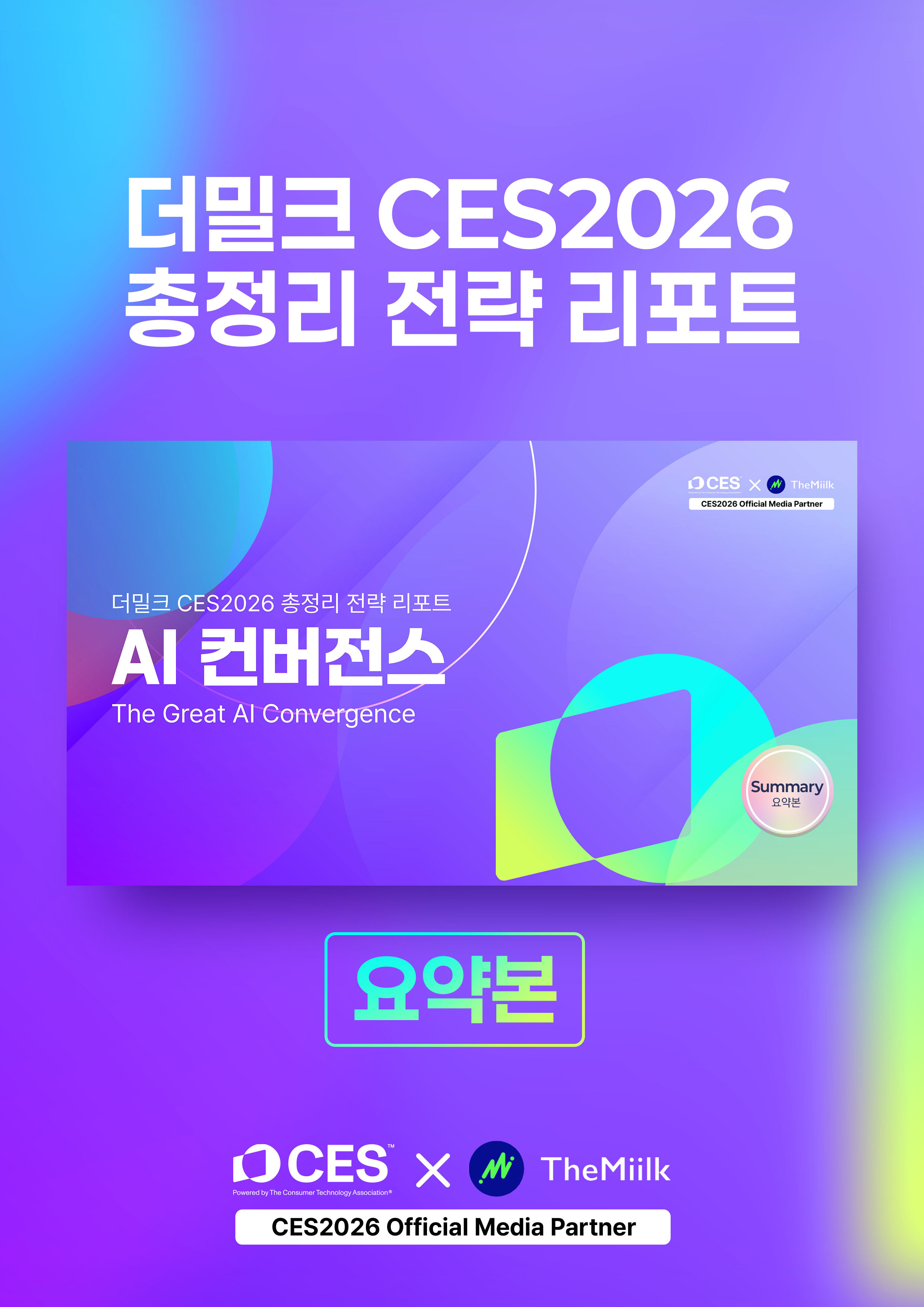파월은 위기라고 쓰고 기회라고 읽었다

[더밀크오리지널 : 파워 오브 파월 #6]
파월은 경제 위기를 경제 구조 개선의 기회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금융위기를 포함한 모든 경제 위기는 불평등이라는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불평등은 전설적인 버냉키와 존경받는 옐런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습니다
제롬 파월 스토리 여섯번째 이야기는, 영웅 파월이 의장 파월의 눈을 가린 순간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시'에 준하는 경제 위기는 언제나 연준에게 평시에는 꿈도 못 꿀 경제 구조 개선을 시도할 명분과 수단을 제공해줬기 때문이다. 경제 위기 때 국민들은 대통령 못잖게 '연준 의장의 입'을 쳐다본다. 언론도 연준 의장의 일거수 일투족을 앞다퉈 보도한다. 평범한 미국민들이 재무장관 이름은 몰라도 연준의장 이름은 아는 이유다. 전임자인 버냉키와 옐런이 모두 기꺼이 전시 대권을 활용했다. 파월도 마찬가지였다.
파월은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버냉키의 양적완화와 옐런의 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겉으로야 주가지수가 회복되고 경제성장률도 평균 2% 전후반대로 견고해보였다. G7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다.
속은 곯아 있었다.
무엇보다 상하위 계층의 소득격차가 너무 컸다.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50%의 소득보다 17배나 많았다. 상위 10%의 자산은 하위 50%보다 236배나 많았다.
불평등 지표는 연준이 '이자율' 등 주요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공식적으로 참고하는 '데이터'는 아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깊이 연구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전설적인 버냉키와 존경받는 옐런이라는 두 명의 전임자들도 골몰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 다.
벤 버냉키 이후 모던 중앙은행으로 변모한 연준이 고용 문제에 집착한 것도 사실 이런 맥락 때문이었다. 인플레이션과 임플로이먼트를 모두 관리하겠다는 버냉키와 옐런과 파월 연준의 공통 목표는 연준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해석한 결과였다.
그래서 파월에게 연준의 핵심 기능은 물가 관리도 고용 관리도 아니었다.
바로 경기(景氣, 이코노미 및 비즈니스) 관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