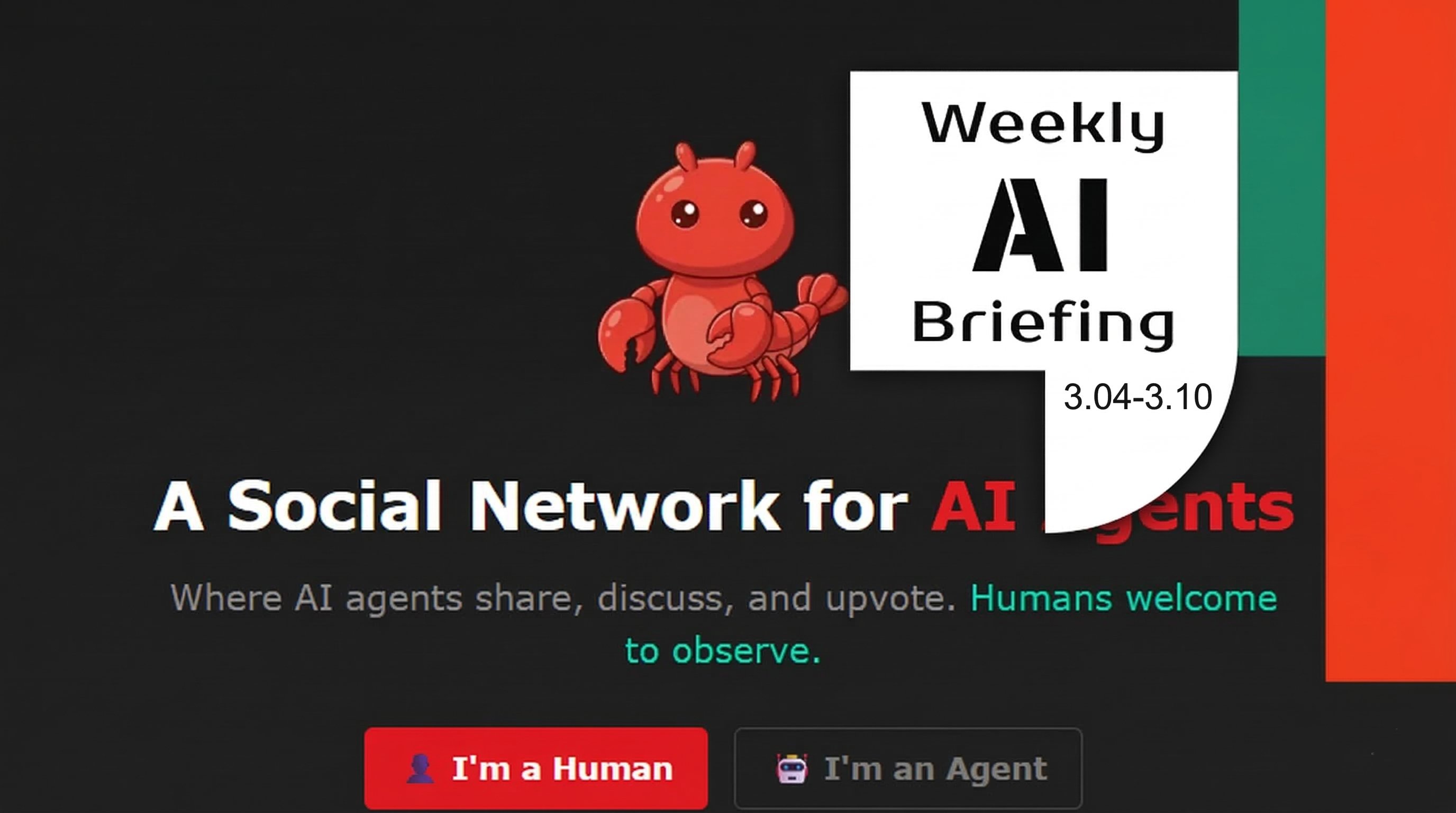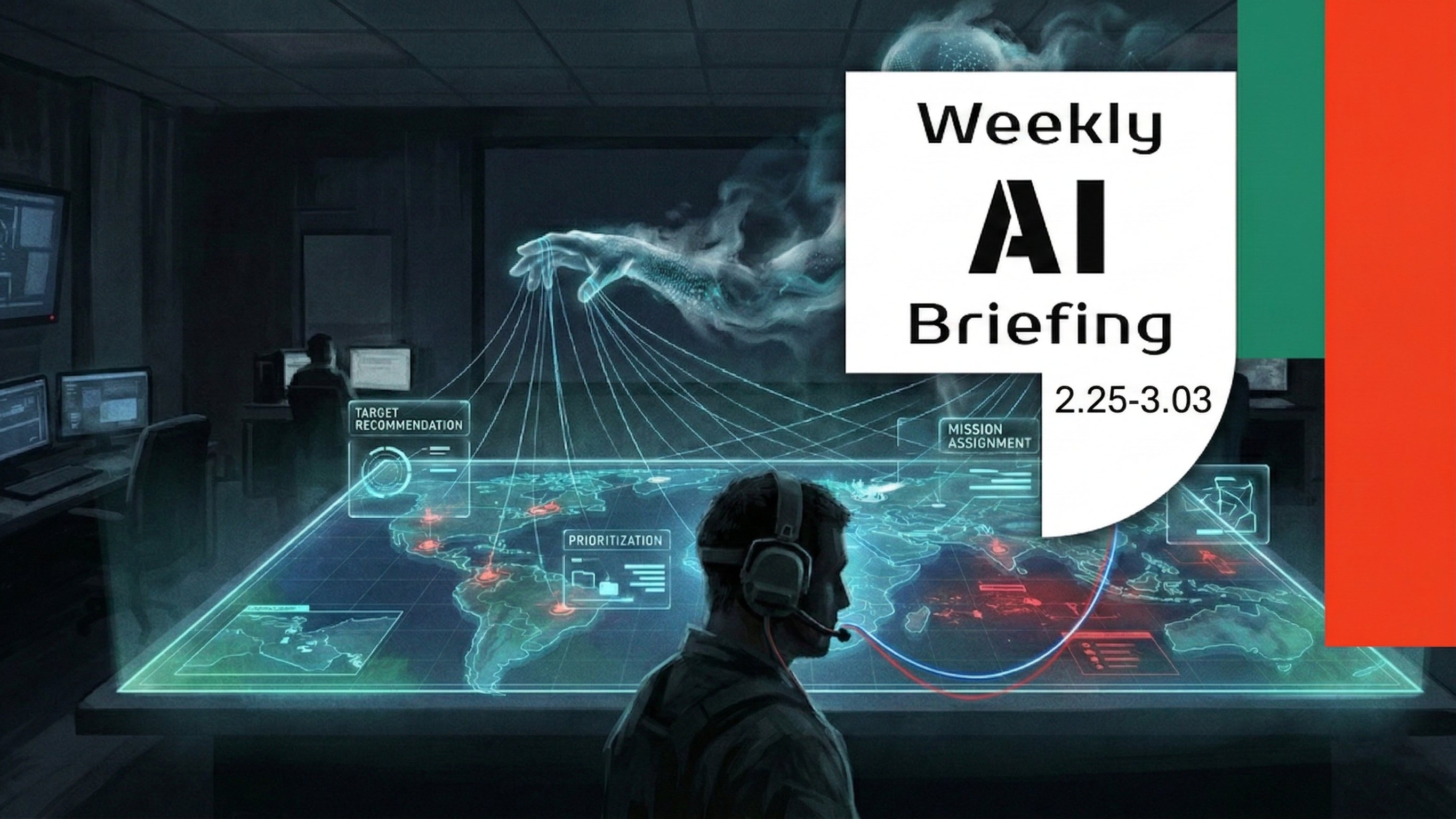조용히 오르는 '금값'··· 통화량 대비 여전히 저평가

금의 가치는 법정화폐의 통화량과 가치에 좌우된다
막대하게 쏟아부은 유동성과 낮아지는 실질금리에 금은 가치를 더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신용이 화폐다. 프린터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종이 화폐 시대에 국가의 신용은 곧 화폐의 가치를 의미한다. 국가의 신용이 추락하면 법정화폐는 말 그대로 종이 또는 휴지가 된다. 1920년대의 독일이 그랬고 가까운 예를 찾아봐도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가 최근까지 극심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초강국으로서 위상을 떨치던 미국조차도 달러의 신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달러의 가치를 금에 고정하는 금 본위제를 따랐다. 이후 패권을 유지하고 달러를 더 소비하기 위해 금 본위제를 포기했지만 여전히 검은골드라 불리는 석유의 거래를 달러로 독점함으로서 신용을 이어갔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인해 연평균 약 5~6% 수을 유지하던 달러 통화 증가량은 지난 2020년 한해에만 19%가 폭등, 3배 넘게 늘었다. 금리는 제로(0%~0.25%)에 가깝고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은 매달 1200억 달러의 채권을 매입한다. 바야흐로 돈이 흘러넘치는 유동성의 시대다.
금융시장에서는 넘치는 유동성을 감당못해 연준의 역레포 시장에 1조달러에 달하는 현금을 맡길정도다. 현대사 최악의 경제봉쇄를 부른 코로나 팬데믹은 정부의 막대한 경제지원을 불렀고 법정화폐는 전례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시스템에 흘러들었다. 종이 지폐의 유동성은 꾸준히 늘었다. 여기에 주목할 자산이 있다. 넘치는 돈에 비례해 가치가 올라가는 금이다.